세상이 하수상하고 험난하다. 이런 세상에서 사회과학도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나는 학사 이상으로 소위 '정통 사회과학'에 몸담을 생각이 별로 없다. 애초에 나는 모든 원서를 정치외교학과 혹은 사회과학대학으로 쓰면서도, 이 이상의 공부를 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치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었을 따름이다. 법학 자체는 인문학이지만 법해석학은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홍성방 교수님의 말을 되새겨보자면, 뭐 결국 내가 공부할 것은 법해석학이니 나도 그렇다면 사회과학을 계속 공부할 것인 모양이다 싶기도 하다.
정치외교학은 꽤 매력적인 학문이다. 엄밀히는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이. 나의 관심사는 국제정치학이었으되 대개 학점은 정치학 쪽이 더 잘 나왔다. 국제정치학은 세계를 살아가는 나를, 정치학은 이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를 조금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한다.정치학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즉 소위 말하는 일반화된 이론(Grand Theory)을 추구하는 것이든 미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든지간에 학부생의 입장에서 정치학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어느 하나 나의 삶에서 벗어나있는 것이 없다는 거였다. 우리나라는 '저발전'의 상태는 아니었의되 '저발전의 정치'는 곧 많은 시사점을 줬다. 과거의 저발전 속의 한국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금 현대의 '발전된 한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 정립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줬다. 그런 수업을 거치고 난 뒤에 나는 훨씬 더 '상식적'이게 되었고 또 그 이상으로 '상식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사회과학대에서 보낸 2년은 그런 시간이었다.
교수님들이 이 글을 보면 꽤나 싫어하실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게 나는 아직도 법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학에 대한 폄하나 부정인 것은 아니다. 과연 내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서든, 내 입장대로 유능한 변호사가 되든 어쩌든지간에 그 때의 내가 서있는 곳은, 한 발은 정치학에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법학에 버티고 서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 고민이 많았던 요즘, '한국정치사' 시간에 손호철 교수님이 자나가듯이 하신 말씀은 꽤 의미심장하다. 고등교육, 대학교육, 사회과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사고방식' 혹은 '관점'이라는 것. 그러고보면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수업들, 달달달 외우고 학점을 챙기고 했던 많은 시간들 속에 내가 머릿속에 밀어넣은 지식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꽤나 열심히 외웠지만 워낙에 휘발성으로 머리에 새긴 탓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지식들,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그네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물론 나는 딱히 질문이 많은 학생은 아닌지라 말이 의사소통이고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한 부분이 많지만) 많은 것이 변화해왔다.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과 지금의 내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조금 허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내가 수십학점을 채워온 정치학 수업들, 그리고 치열하게 읽었던 그 텍스트들이었다. 많은 지식들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사고하는가'가 남아있었다.
사실 이것은 '대학교육 무용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박 중 하나이면서도 가장 의미없는 반박이기도 하다. 대학교육 무능론이 사회에 팽배해있다. 실제로 내가 바라보기에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과잉투자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옛날에 인터넷으로 알고 지낸 여러 사람 중 혹자는 대학교육을 강요하는 사회를 욕하면서 동시에 대학 그 자체를 욕하기도 했는데, 나는 전자는 긍정하되 후자에까지 긍정할 수는 없다. 나는 대학에서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 공부 외의 활동이라곤 봉사 동아리 하나가 다인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후회가 있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다른 활동만큼이나 나는 공부에서 값진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대학교육 무용론에 대한 가장 큰 반박인 '사회과학적 사고'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과학대, 그 외연을 넓혀보더라도 사고를 통해 공부하는 인문대에 국한될 이야기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자연대나 공대와 같은 여러 학문 전체를 포섭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의미없는 반박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이 든다.
바티칸을 여행하던 무렵,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을 때 나왔던 한 여행사의 가이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신은 항상 천재들에 열광해왔다고.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소개했다. 그네들이 죽어서마저 건네는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찬양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며 느꼈던 것들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 혹은 강사님들, 그리고 내 옆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우들 모두가 내게는 '천재'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통찰력과 분석력,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주장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그네들의 능력에 종종 탄복하곤 했다. 그리고 그네들은 내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줬다. 가깝게는 헌팅턴이나 왈츠, 프란시스 후쿠야마. 넓게는 이근욱 교수님(이자 학과장님)과 그밖의 더없이 좋으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종종 글을 통해 만나는 '얼굴모를' 많은 학자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학을 생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던 나를 정치학으로 한없이 깊이 끌어들였던 것 같다. "직업으로서의 정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마도 "취미와 관심사로서의 정치"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달려들게다.
대학 생활의 절반이 끝났다.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는 꽤 여유롭게 보냈다. 한학기를 마무리하고 입대하면서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하나 흑역사로 남기지 않기에는 아까운, 훌륭하리만치 안좋은 기억들이다. 그러나 남은 학기에 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다. 그렇게 징징대면서도 매학기 전공은 5과목씩 밀어넣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이 대학사회를 벗어나 진짜 '한국'사회에 뛰어들 때 나는 무엇을 들고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진로가 결정된 지금도 미래를 바라보는 나는 불안하다. 나는 2년 뒤, 그리고 5년 뒤, 그리고 그보다도 몇 년 뒤, 무얼하고 있을까. 많은 기대와 많은 우려가 교차한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실무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도 있다. 나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있지 않다. 그렇기에, 조금 꼰대처럼 말하자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시기일지도 모를 지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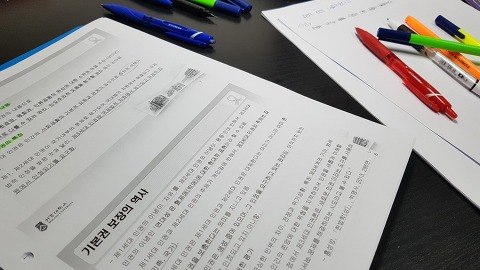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