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책에나 따라붙는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거칠게 말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책도 물건인만큼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내게 <살인자의 기억법>은 어떤 페친이 찍어 올린 사진이었다. 제목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고. 그냥 언젠가 한 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덮어놨었다. 나중에 순천에 내려와서 도서관에 있는지 찾아보다가 없네,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
한창 다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한지는 이제 한 달도 안됐다. 아직도 책을 읽는 습관이 완전히 돌아온건 아니다. 그렇게 의무감처럼 다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도 안들고. 한동안은 오랜만에 계속 일본 소설만 읽었다. 그래봤자 네댓권 빌려와서 한 권이나 겨우 읽고 반납하는 것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다가 문득 슬슬 한국소설도 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한창 책을 만힝 볼 때도 한국소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는데, 그건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많은 작가, 너무 많은 소설이 내 앞에 있었고, 골라읽기는 힘들다못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지간한 성공을 거둬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번역소설과는 달랐다.
그러다 문득, 다시 김영하를 집었다. 김영하의 책이라고는 여행자도쿄 뿐이었다. 그건 소설도 아닌 여행기였고.
◇
굳이 줄거리를 풀어놓아보라고 한다면 치매(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마 김병수가 김은희라는 요양사를 죽이고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이다. 책은 얄팍하고 여백은 많다. 책의 외양만큼이나 텍스트의 양은 굉장히 가볍다. 그렇다고해서 '극도로 절제된' 느낌을 주는건 아니다. 적은 양의 글 속에서 나름의 감정을 필요한만큼 충분히 표현해낸 소설이다.
안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드는데, 옛날에는 100의 텍스트를 120에 표현해내는 글쓰기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너무 적은 것을' 탐닉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긴 글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140자의 트위터, 그리고 딱히 제한은 없지만 긴 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SNS들에 열광하는 이유도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결여'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인자의 기억법>처럼, 요즘은 절제(또는 결여)있는 분량조절이 필요한 시대라고나 할까.
◆
금방 말해놓고 다시 뒤집기는 뭐하지만, 사실 이 소설은 결여와 절제의 아슬아슬한 선 위에 있다고 본다. 뭔가 결여된 듯 절제된 듯. 결국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서술자를 통해 그려지는 이 소설 속의 세상은 위태위태하고 부실하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결국 알 수 없다. 싸이코패스라는 범주에 속할법한 김병수는 정말로 김은희를 죽인 것인가. 박은태는 정말로 경찰일까. 어느 쪽이 진실일까. 마지막에 맞이한 결말? 아니면 결말에 이르기까지 김병수가 믿고 있었던 것?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김병수에게는 이를 확인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야기를 훔쳐보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은 미묘한 느낌으로 책장을 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이나 '용두사미식 결말'과는 느낌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쟀든 다르다. 소설 속에서 김병수가, 자신이 살인이라는 행위에서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서 글이 싫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던가. 그런 것처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에 이르렀을 때 독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흔히 '얼탄다'라고 말하지 않던가.
◇
줄거리 자체가 비슷하다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다 보고 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가 생각났다. 줄거리보다, 담고 있는 이야기보다 그 구성과 편성에 더 눈길이 가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 빼놓을 것도 없지만 그 정점에 구성이 있다는 느낌.
◆
인터넷은 참 편한 매체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책을 읽고나면 첫번째 습관이 바로 인터넷에서 그 책을 찾아보는 일이다. 대부분 눈팅에 끝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가 궁금해서다. 신분상 독서모임같은 데에 나가기가 어려우니 일종의 대리만족이랄까. 그렇게 훑어보던 서평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서평 쓰기 어려운 책"이라고. 동감이다. 그냥 있는대로 써내자니 너무 평범한 이야기같다. 이 책의 진면목을 덮어버리는 것 같다. 다듬어보자니 어떻게 다듬어야할지 모르겠다. 그런 책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너무 쉽게 읽혔다면 그 순간부터 이 책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저자의 다른 책에서의 말을 인용했던 해설에 뜨끔했듯이, 내겐 이 책이 너무 술술 읽혔다. 누구에게나 그럴 것이다. 얇고, 흥미롭고, 문장은 물흐르듯 술술 풀려나간다. 어느새 다음줄에 탐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즈음이면 이미 책의 마지막장을 덮고 있다. 과연 나는 이 책을 바르게 읽은 것일까. 많지 않은,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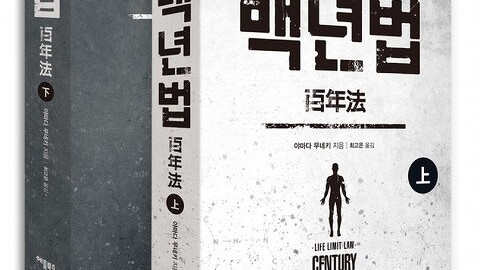


댓글